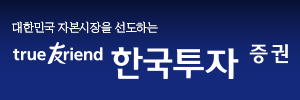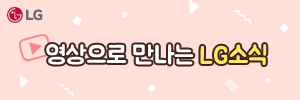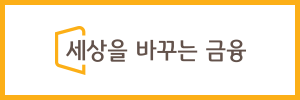“지니어스 법으로, 글로벌 금융에 스테이블코인발 빅뱅 시작”
이코노미스트, “토큰화에 JP모건, 블랙록 등 월가 지각변동…은행·카드사에도 ‘위기감’ 고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이 전 세계 금융업계의 ‘빅뱅’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이에따라 △가상화폐와 △토큰화 자산이 월스트리트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년 새 60% 급성장해 3년 내에 2조 달러(약 2764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최근 보도했다. 로빈후드·제이피모건·블랙록 등 대형 금융기관도 관련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보수적인 금융인들 사이에서 가상화폐의 ‘활용 사례(use cases)’는 종종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가상화폐와 유사한 붐과 실패를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디지털 자산들은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왔다. 밈코인(meme coin)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에 투자했던 과열된 투자자들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투기나 금융 범죄 외의 목적에서, 가상화폐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했다.
그러나 최근의 열풍은 다르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GENIUS)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달러 등 전통적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규제의 명확성을 부여하는 법.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었다.
관련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고, 월가의 금융회사들도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토큰화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주식, 머니마켓펀드(MMF), 사모펀드 지분(private-equity stakes) 그리고 채권까지 다양한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혁명처럼, 혁신가들은 열광하고 기득권자들은 불안해한다.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인 로빈후드의 블라드 테네브 최고경영자(CEO)는 “이 기술은 가상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추가 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이같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화폐의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고 경고한다.
이번 흐름은 이전의 ‘비트코인 투기’나 ‘디지털 금’ 논의보다 훨씬 파괴력이 크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은 다른 자산을 대표하는 포장지(wrappers) 또는 수단(vehicles) 역할을 한다. 얼핏 별 것 없어 보이지만, 상장지수펀드(ETF)나 유로달러, 증권화된 부채(securitised debt)처럼 단지 자산을 포장·분절·재조합하는 방식의 변화가 현대 금융에서 가장 혁신적인 예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630억 달러(약 363조 5186억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 중이다. 이는 1년 전보다 60% 증가한 수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이 시장이 3년 내에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제이미 다이먼 CEO의 가상화폐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제이피모건도 스테이블코인 유사 제품(JPMD·JPMorgan Deposit token)의 출시를 발표했다. 토큰화된 자산 시장은 250억 달러(약 34조 5650억 원) 규모로,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로빈후드는 지난 6월30일 유럽 투자자들을 위해 200개 이상의 토큰을 출시, 정규 시간 외에도 미국 주식과 ETF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이 낮고, 속도가 빠르다. 디지털 장부에 즉시 소유권이 기록되기 때문에, 중간 결제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국경 간 결제에서는 탁월한 이점을 지닌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는 세계 전체 금융 거래의 1% 미만이지만, 지니어스 법안으로 본격 확산이 기대된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증권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존, 월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고려 중이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기프트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려 한다. 수수료를 아끼는 대신 할인 제공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회사는 ‘수수료로 2%를 받아오던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토큰화 자산은, 실물 자산(펀드, 주식, 원자재)을 디지털로 복제한 것.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거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일부는 그저 24시간 거래를 위한 ‘술책(gimmicky)’이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토큰화된 MMF다. 이는 미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기반으로 하며, 결제수단과 투자수단을 동시에 충족한다. 미국의 평균 예금 금리는 0.6% 이하인데, MMF는 4%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블랙록의 토큰화 MMF는 이미 20억 달러(약 2조 7650억 원)를 넘겼다. 래리 핑크 CEO는 “토큰화 펀드는 머지않아, 투자자들에게 마치 ETF처럼 익숙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 토큰화의 흐름에 참여하려 하지만, 기존의 은행예금 상품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 소매예금의 10%만 스테이블코인·토큰으로 빠져나가도, 은행의 조달금리는 2.03%에서 2.27%로 올라간다.
이뿐 만이 아니다. 로빈후드의 주식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는 주식가치와 배당에 연동된 파생상품에 가깝다. 따라서 주식 보유시 부여되는 의결권도 없다. 만약 발행회사가 파산하면, 투자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핀테크 기업인 링크토(Linqto)의 파산에서 발생했다.
토큰화의 가장 혁신적인 영역은 ‘사모자산(private assets)’의 대중화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이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수 사모 기업의 지분 일부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증권공시 요건은 사라지고 유동성 제공 책임도 없다. ETF처럼 자산을 사고팔며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처럼 거래되면서도 규제는 피할 수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된 증권도 여전히 증권이며, 공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우 다양한 새로운 구조의 자산들이 쏟아지면서, 규제당국은 계속해서 따라가기 바쁠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이 정말로 유용해지려면, 그만큼 더 파괴적이게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토큰화 자산이 매력적일수록, 기존 금융 생태계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가상화폐는 아무 혁신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는 것.
권세인 기자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