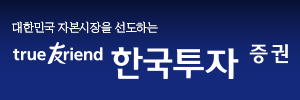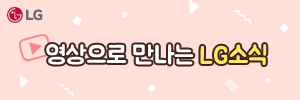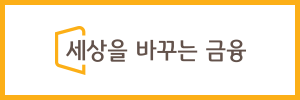“인터넷은 이제 디지털 국경으로 쪼개진 '스플린터넷(Splinternet)’ 됐다”
이코노미스트, “‘거리의 죽음’은 옛말… 미·EU, 강력한 디지털 규제로 보호주의 장벽 높여”
한때, ‘거리의 죽음(the death of distance)’이 선언되던 시절이 있었다. 인터넷이 지구촌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어버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무국경 비즈니스’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거래에 대해, 미국이 저가 수입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폐지했고 유럽연합(EU)은 강력한 디지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이 각국별로 쪼개지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 심화하고 있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분석했다. 이에따라, 애플·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전 세계의 동일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각국별로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돼 혁신이 저해되는 한편, 신기술 출시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언론인이던 프랜시스 케언크로스는 지난 1997년 ‘거리의 죽음’을 선언했다. “통신 기술이, 비즈니스와 개인 생활에서 지리적 제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녀는 동명의 저서에서 주장했다. 일부 주장은 과장이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확했다. 주요 시장에서 온라인 세계에서는 ‘거리’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단, 공산당이 ‘만리방화벽’이라는 사이버 장벽을 세운 중국만 제외하면.
그러나 이제 그 ‘거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8월 29일 800달러(약 111만 1600원) 미만의 물품이 들어있는 해외 소포에 대해 면세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래전인 1930년 관세법(Tariff Act)의 일부로 처음 제정됐던 규정. 본래는 세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과 테무 같은 기업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발판이 됐다. 이들은 ‘데 미니미스(de minimis)’라는 면세 혜택을 활용, 초저가 상품을 제공하며 미국 소비자를 사로잡아왔다. 이번 조치로 이 특례는 사실상 폐지됐다.
이 ‘데 미니미스’ 제도의 종말은 디지털 기업들에게 “국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리고 “국경 없는 비즈니스 모델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상징적 신호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해석했다. EU는 이미 온라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칙도 마무리 단계다. 조만간 EU 관료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구 트위터)의 콘텐츠 정화 부족 문제를 이유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EU는 지난 4월 애플에 5억 유로(약 8143억 1500만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7억 2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때문이었다. DMA는 27개 회원국 내에서 빅테크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한다. 호주와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국가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애플,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5대 빅테크다. 이들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는 사실상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쌓였다. 물론 일부 현지화 번역이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는 공산당이 싫어하는 앱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세계는 국가별·지역별 인터넷으로 쪼개지고 있다. 이는 빅테크 5대 기업에게,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가 강화된 시장 접근을 유지’할 것인지 불편한 선택을 강요한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규제가 과도한 시장을 아예 포기하는 것. 2023년 캐나다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뉴스 매체의 기사 링크를 검색결과 또는 소셜 피드에 올릴 경우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을 통과시켰다. 구글은 정부 기금에 1억 캐나다 달러(약 1004억 8800만 원)를 내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메타는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캐나다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링크 자체를 차단했다.
메타 입장에서 수익 타격은 크지 않았다. 뉴스는 전 세계 페이스북 피드의 3%에 불과하기 때문. 그러나 이런 규제가 확산되면, 특히 더 큰 시장과 핵심 사업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철수 전략’은 점점 매력을 잃게 된다. 중국에서의 구글 사례는 이를 보여주는 실험과 같다.
2010년, 구글은 공산당의 검색 검열 요구를 거부하고 중국 시장을 떠났다. 당시 중국 매출은 연간 약 3억 달러(약 4168억 5000만 원), 글로벌 매출의 1% 남짓이었다. 구글은 평판 훼손 비용이 더 크다고 보고 철수를 선택했다. 아마 옳은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비용은 컸다. 만약 구글이 그때 남았다면, 애플처럼 빠르게 성장해 지금까지 누적 매출이 400억 달러(약 55조 5800억 원)에 달했을 것이다. 구글이 2024년 기준 애플 수준의 17%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면, 600억 달러(약 83조 3700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현재 빅테크 매출의 25~60%는 미국 이외에서 발생한다. 자국시장은 규제가 느슨하고 수익성이 높다. 따라서 주요 해외 시장이 중국처럼 변한다면, 철수는 선택지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남는 것 역시 비용을 수반한다. 예컨대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DMA에 따른 첫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제출했다. 1만1000명의 직원이 2년간 59만 시간을 투입해 제품을 규정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메타 직원의 평균 보상(연차·공휴일 포함)은 시간당 190달러(약 26만 4005원) 수준. 단순 계산하면 59만 시간의 직접 비용은 1억1000만 달러(약 1528억 4500만 원)다. 하지만 만약 그 인력이 매출 창출 업무에 투입됐다면, 2년간 기회비용은 10억 달러(약 1조 3895억 원)에 달한다.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매출 기여도가 2022년 130만 달러(약 18억 635만 원), 2023년 200만 달러(약 27억 7900만 원)였던 점을 감안한 수치다. 이는 같은 기간 메타 유럽 매출의 2% 수준.
이 와중에 신제품 출시는 지연된다. 2023년 이후 알파벳,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도구를 유럽에 출시하는 데 수개월씩 늦춰야 했다. 그 사이에, 규제를 받지 않는 중소 경쟁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간다.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을 기다리다 지친 유럽 소비자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대신 선택했을 수도 있다.
빅테크는 이제 이런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동시에 닥치는’ 난관들과 씨름하는데 더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충고했다.
권세인 기자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